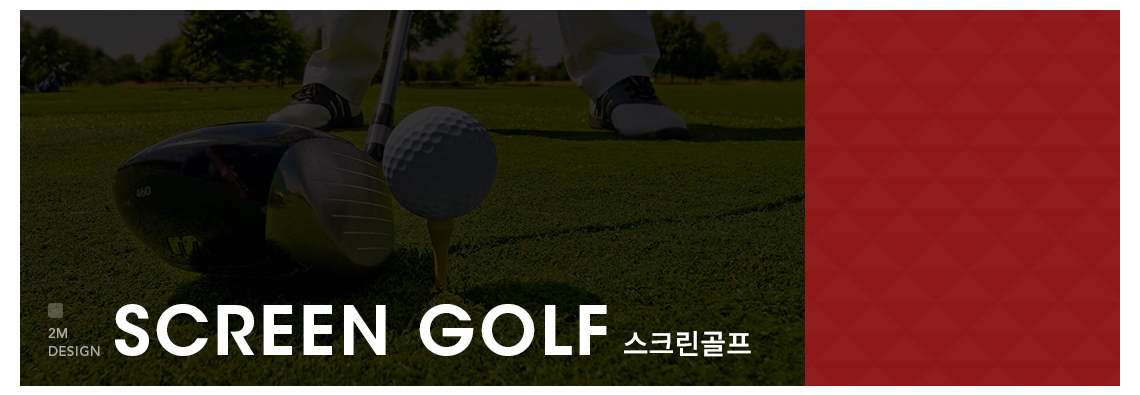SCREEN GOLF 목록
오션파라다이스 게임 ┤ 프라그마틱 슬롯 사이트 ┤
페이지 정보
춘리솔솔 25-05-08 07:31 4회 0건관련링크
-
 http://50.rsg351.top
0회 연결
http://50.rsg351.top
0회 연결
-
 http://77.rtz245.top
0회 연결
http://77.rtz245.top
0회 연결
본문
한국파친코 ┤ 알라딘게임잭팟 ┤∈ 71.rcc734.top ▣일러스트레이션 유아영
‘나는 한낮의 하늘에 부조되는 장엄한 무늬를/ 보았다. 나의 것인 뜨거운 꿈 하나가/ 그 근처에 벌써 앉아 있었다/ 구름의 흰 살에 일어나는 물결들// …바람이 불어온다. 흩어져라. 단단한/ 풀씨들이여. 사랑의 열들이여/ 날아올라라…흰 욕망들이여// …이제 삶은 신성한 정지이며/ 그의/ 그림자인 풍경만이 변모한다/ 그의/ 입김인 바람은 흩어진다. 소리의 철책 사이에서// 새여,/ 슬픔의 첨탑 위로 떨어지는 푸른 입술이여….’
시는 삼할은 암호 같은 것이어서 쉬이 오지 않는다. 독자는 자꾸 읽어보는 수밖에 방법이 없다. 시인의 의도야 어찌 됐든 거기서 깨득한 것이 내 몫이고, 내 마음은 그만큼 살찌기는 할 것이다 광주 수협 . 이 시, 시인 장석의 ‘풍경의 꿈’ 부분이다. 1980년 ‘조선일보’ 신춘문예 당선작이다. 그해 ‘연혁’(중앙일보)의 황지우와 나란히 등단했다. 평론가 남진우는 이 시를 ‘한국 현대시 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아름답고 격조 있는 언어의 조직’이라 상찬했다 한다. 날아오르고 흩어지고, 리듬을 가진 말들이 아름답다. 아름답지만 만져볼 수는 없는 것처 생존경제학 럼, ‘슬픔의 첨탑 위로 떨어지는 푸른 입술’은 무엇일까, 자꾸 읽어보아도 닿지 않는다.
윤석열 파면 전후로, 장 시인과 코가 삐뚤어지게 막걸리를 두번 마셨다. 자기 차례의 말을 빨리 넘기고 싶은 사람처럼 그의 말은 느리고, 적고, 깊었다. 그는 낯익은 두번째 자리에서야 ‘풍경의 꿈’을 얘기했다. ‘힘들고 불쌍했던 어떤 젊은 영혼’이라 했 우리은행마이너스통장자격 다.
“이 시가 박두진 선생님이 뽑아주신 등단작입니다만 지금 봐서는 그 시대의 정신을 온전히 드러내는 시라고 할 수 없지요. 한 시대를 겪는다는 것은 머리로도 겪고 가슴으로도 겪고, 또 몸으로도 겪잖아요. 시인이 시대의 구경꾼일 수는 없으므로, 당연히 반독재, 민주와 통일을 위해 나아가야 했는데 그 당시 지배의 언어였던 참여시라 할까, 그 기금법 런 시를 참 쓰기 어려웠어요.”
그 ‘푸른 입술’은 ‘좌절’인가요, 라고 물었다. 이런 막된 질문은 막걸리 자리가 아니면 불가하다. 사실 ‘슬픔의 첨탑 위로 떨어지는 푸른 입술’은 ‘칸칸이 밤이 깊은 푸른 기차’(서정춘)라거나,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김광균)만큼이나, 그것이 무엇을 담고 있든지 그 무늬 자체로 아름답다.
수시지원기간“지금 읽어봐도 왜 시의 끝이 흩어질까, 흩어질까, 그때 그랬었구나, 이렇게 발이 잘 보이지 않을까 힘들었었구나, 하지요. 결과적으로 저는 당연히 그 시대의 젊은이로서 해야 할 바를 다하지 못했죠. 저 자신을 오랫동안 용서를 못 했어요. 부채 의식이라 할 수도 있고 부채 의식을 좀 넘어서는, 어떤 기대의 지평선에 다다르지 못한…. 엄혹한 시대에 시는 하나의 도구와 무기가 돼야 한다는 생각도 있었고, 그런데 내 시는 너무 말랑말랑해서 이게 짱돌이 될 수는 없었던 거죠. 용기 있게 쓸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것 같아요.”
1980년 그날 이후, 황지우는 들로 나아갔고, 장석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는 통영 바다로 갔다. 가업을 이어 굴 양식업에 전념했다. 부친은 평북 영변에서 월남했고, 외가는 전남 순천이다. 부산에서 태어나 거제 통영 순천을 오가며 바닷가에서 자랐다. ‘사공은 직선의 줄을 잡아당기지만/ 출렁출렁 갈지자의 곡선으로 나아가던/ 도선 위의 나’, 시 ‘통영항1’처럼 훗날, 그의 시 원천은 바다였다.
노회찬과 경기고에서 만났다. 1, 2학년 같은 반이었다. 노회찬이 ‘동아일보’ 백지광고 모금에 나서고 4·19 묘지에 참배 갈 때, 장석은 “나 같은 애들은 각성이 안 돼 소설이나 문학작품 그런 거에 탐닉했죠”라고 했다고, ‘노회찬 평전’(이광호)에 나온다. 노회찬이 ‘매일노동뉴스’ 발행인(1993~2003) 할 때의 일이다. 언제 노동언론이 궁하지 않은 때가 있었던가, 장석에게 전화가 온다. 10명이 넘는 직원들의 월급날, 아니면 그 전날. “눈에 선하잖아요? 구하다 구하다 못해,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 한 것을 내가 알지요.” 노회찬은 그때 카드 돌려막기를 하다가 신용불량자가 되지만, 월급은 한번도 밀리지 않았다. 뒤에 장석이 있었고, 그 독지의 세월이 10년이다. 한번은 압록강 조중 접경지역을 함께 여행했는데 그때 만난 조선족들의 밑바닥 이야기가 노회찬의 명연설, ‘6411 버스와 투명인간’의 모티브가 되었다고 한다.
2001년 ‘관점 있는 뉴스, 프레시안’이 나올 때 장석은 또 어떤 이끌림에 따라 창간 주주가 되었고, 지금은 배당금이 한번도 없었던 이 언론사의 최대 주주로 남아있다. 그는 인물사전에 ‘언론인’으로 나온다고 한다.
그해, 또 어떤 이끌림에 따라 ‘이우학원’에 발을 들여놓는다. 도시형 대안학교 이우는 100인의 자발적 기부를 종잣돈으로 출발했다. 그는 여기서도 시종 뒷배가 되었고, 월급 없는 이사장으로 여러 해 일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들어, 노무현 사람들이 ‘폐족’이 되어 나갈 즈음, 얼마 전 타계한 정수일 교수도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쫓겨났다. 그가 이 땅에서 오갈 데 없을 때, 한 공간이 열린다. ‘문명교류연구소’, 또 어떤 이끌림에 따라, 장석이 마련한 연구소다. 실크로드 답사를 비롯하여 학술, 출판 등 많은 일들을 함께했다. 정수일의 만년 역작들이 여기서 나왔다.
장석의 등단 햇수는 5·18 주기와 같다. 2020년 5·18 40주기, 장석은 40년 침묵을 깨고 시집 2권을 발표하면서 시단으로 돌아온다. 첫 시집 ‘사랑은 이제 막 태어난 것이니’, 그 첫편이 ‘서시’다. ‘온몸으로 앉아 있는 바위/ 전신만신의 둥근 달/ 혼신을 다해 붉은 꽃/ 멍청한 돌부처/ 그리고 사랑은/ 이제 막 태어난 것이니.’
은허맥수(殷墟麥穗)라 하여, 폐허가 되어버린 은나라 도읍지에 보리 이삭이 팬 것 같고, 절의 무덤인 폐사지에 늙은 돌부처, 옛 종소리를 홀로 듣고 있는 풍경 같다.
두번째 시집, ‘우리 별의 봄’. 그해는 노회찬 2주기이기도 하다. ‘…새하얀 분노로/ 나와 그대 사이의 금들이/ 덮여 있습니다/ 첫눈이라는 이름으로 덮여 있습니다.’(첫눈). 그리고 이어지는 시, 조시다. ‘너는 아주 빠르게 내려왔다/ …우리의 심장 속으로 쿵하고 들어왔다/ …다시 오르겠다/ 비창의 발걸음으로/ 너의 여진이 되어…/ 해일로 몰려가는 우리를 보아라.’
세번째 시집, ‘해변에 엎드려 있는 아이에게’. 여기에 그는 ‘오월은 마흔 번이 넘게 나를 깨웠네’라고 썼다. ‘…오월은/ 떨어지는 또 젊은 불꽃으로/ …삶에 늘 가래가 끓어/ 젊음에서 낡아가던 내 가난한 전성기/ …바다에 이르러 몸을 섞는 강물처럼/ …어깨에 손을 대고 흔드는 오월/ 이제 깨어 그곳으로 나도 흐르네.’
그해 계엄이, 그해 오월이, 이렇게 되풀이될지는 꿈에도 몰랐다. 악은 ‘계몽’처럼 변화하고 있다. 개선장군으로, 성직자의 모습으로, 천의 얼굴로 탈바꿈하며 악은 변주하고 있다. ‘앞서서 나가니 산 자여 따르라’는 김종률의 노래로는 막을 수 없다. 횃불과 촛불로는 그 얼굴을 분별할 수 없다. ‘멈춰져 버린 이 시간’, 우리 다시 만나기 위해서는 ‘소녀시대’를 불러야 하고, 바람에도 꺼지지 않는 엘이디(LED) 등을 켜야 한다. 시인은 그런 얘기를 했다. 그는 시, ‘오월은…’ 말미에 ‘남은 깃발이 있으면 주시오, 노인의 얼굴로 이제 봄길을 달리려 하네’라고 쓰고 있다.
2023년 네번째 시집 ‘그을린 고백’을, 이듬해 다섯번째 ‘목탄 소묘집’을 발표하며 장석은 늙은 전성기를 열고 있다. 시 선집 ‘너는 사람의 길을 가지 말아라’(연어의 꿈)가 일본에서 발간돼 아사히신문에 소개되기도 했다. 그는 세번째 시집을 내고 나서야 “‘너도 그때 용기는 다하지 못했지만 참 안 됐었다’라고 스스로 용서할 수 있었다”고 했다.
어디서 왔을까, 자꾸 잡아끄는 또 어떤 이끌림. 40년을 침묵하였으되 장석은 그 장력에서 이탈하지 않았다. 한 뿌리에서 뻗은 가지처럼, 손을 뻗으면 늘 닿을 거리에 있었던 그의 삶과 꿈, 그런 생각이 든다.
‘내가 숲이었다/ 젊은 참나무였다// 톱은 단지/ 수피와 심재를 후벼 끊었을 뿐// 나는 내 영혼을/ 드센 불의 정념에/ 적막의 시간에/ 의심 없는 어둠에 두어// 이렇게 검게 빛나며/ 비어 있었다// 어떤 인연이기에/ 빨갛게 이글거리는 눈을/ 다시 열어/ 당신의 영혼을 바라보는가.’
되살아나는, 꽃이 아닌 불꽃으로 되살아나는, 그의 시 ‘숯’의 전문이다.
이광이
‘나는 한낮의 하늘에 부조되는 장엄한 무늬를/ 보았다. 나의 것인 뜨거운 꿈 하나가/ 그 근처에 벌써 앉아 있었다/ 구름의 흰 살에 일어나는 물결들// …바람이 불어온다. 흩어져라. 단단한/ 풀씨들이여. 사랑의 열들이여/ 날아올라라…흰 욕망들이여// …이제 삶은 신성한 정지이며/ 그의/ 그림자인 풍경만이 변모한다/ 그의/ 입김인 바람은 흩어진다. 소리의 철책 사이에서// 새여,/ 슬픔의 첨탑 위로 떨어지는 푸른 입술이여….’
시는 삼할은 암호 같은 것이어서 쉬이 오지 않는다. 독자는 자꾸 읽어보는 수밖에 방법이 없다. 시인의 의도야 어찌 됐든 거기서 깨득한 것이 내 몫이고, 내 마음은 그만큼 살찌기는 할 것이다 광주 수협 . 이 시, 시인 장석의 ‘풍경의 꿈’ 부분이다. 1980년 ‘조선일보’ 신춘문예 당선작이다. 그해 ‘연혁’(중앙일보)의 황지우와 나란히 등단했다. 평론가 남진우는 이 시를 ‘한국 현대시 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아름답고 격조 있는 언어의 조직’이라 상찬했다 한다. 날아오르고 흩어지고, 리듬을 가진 말들이 아름답다. 아름답지만 만져볼 수는 없는 것처 생존경제학 럼, ‘슬픔의 첨탑 위로 떨어지는 푸른 입술’은 무엇일까, 자꾸 읽어보아도 닿지 않는다.
윤석열 파면 전후로, 장 시인과 코가 삐뚤어지게 막걸리를 두번 마셨다. 자기 차례의 말을 빨리 넘기고 싶은 사람처럼 그의 말은 느리고, 적고, 깊었다. 그는 낯익은 두번째 자리에서야 ‘풍경의 꿈’을 얘기했다. ‘힘들고 불쌍했던 어떤 젊은 영혼’이라 했 우리은행마이너스통장자격 다.
“이 시가 박두진 선생님이 뽑아주신 등단작입니다만 지금 봐서는 그 시대의 정신을 온전히 드러내는 시라고 할 수 없지요. 한 시대를 겪는다는 것은 머리로도 겪고 가슴으로도 겪고, 또 몸으로도 겪잖아요. 시인이 시대의 구경꾼일 수는 없으므로, 당연히 반독재, 민주와 통일을 위해 나아가야 했는데 그 당시 지배의 언어였던 참여시라 할까, 그 기금법 런 시를 참 쓰기 어려웠어요.”
그 ‘푸른 입술’은 ‘좌절’인가요, 라고 물었다. 이런 막된 질문은 막걸리 자리가 아니면 불가하다. 사실 ‘슬픔의 첨탑 위로 떨어지는 푸른 입술’은 ‘칸칸이 밤이 깊은 푸른 기차’(서정춘)라거나,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김광균)만큼이나, 그것이 무엇을 담고 있든지 그 무늬 자체로 아름답다.
수시지원기간“지금 읽어봐도 왜 시의 끝이 흩어질까, 흩어질까, 그때 그랬었구나, 이렇게 발이 잘 보이지 않을까 힘들었었구나, 하지요. 결과적으로 저는 당연히 그 시대의 젊은이로서 해야 할 바를 다하지 못했죠. 저 자신을 오랫동안 용서를 못 했어요. 부채 의식이라 할 수도 있고 부채 의식을 좀 넘어서는, 어떤 기대의 지평선에 다다르지 못한…. 엄혹한 시대에 시는 하나의 도구와 무기가 돼야 한다는 생각도 있었고, 그런데 내 시는 너무 말랑말랑해서 이게 짱돌이 될 수는 없었던 거죠. 용기 있게 쓸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것 같아요.”
1980년 그날 이후, 황지우는 들로 나아갔고, 장석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는 통영 바다로 갔다. 가업을 이어 굴 양식업에 전념했다. 부친은 평북 영변에서 월남했고, 외가는 전남 순천이다. 부산에서 태어나 거제 통영 순천을 오가며 바닷가에서 자랐다. ‘사공은 직선의 줄을 잡아당기지만/ 출렁출렁 갈지자의 곡선으로 나아가던/ 도선 위의 나’, 시 ‘통영항1’처럼 훗날, 그의 시 원천은 바다였다.
노회찬과 경기고에서 만났다. 1, 2학년 같은 반이었다. 노회찬이 ‘동아일보’ 백지광고 모금에 나서고 4·19 묘지에 참배 갈 때, 장석은 “나 같은 애들은 각성이 안 돼 소설이나 문학작품 그런 거에 탐닉했죠”라고 했다고, ‘노회찬 평전’(이광호)에 나온다. 노회찬이 ‘매일노동뉴스’ 발행인(1993~2003) 할 때의 일이다. 언제 노동언론이 궁하지 않은 때가 있었던가, 장석에게 전화가 온다. 10명이 넘는 직원들의 월급날, 아니면 그 전날. “눈에 선하잖아요? 구하다 구하다 못해,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 한 것을 내가 알지요.” 노회찬은 그때 카드 돌려막기를 하다가 신용불량자가 되지만, 월급은 한번도 밀리지 않았다. 뒤에 장석이 있었고, 그 독지의 세월이 10년이다. 한번은 압록강 조중 접경지역을 함께 여행했는데 그때 만난 조선족들의 밑바닥 이야기가 노회찬의 명연설, ‘6411 버스와 투명인간’의 모티브가 되었다고 한다.
2001년 ‘관점 있는 뉴스, 프레시안’이 나올 때 장석은 또 어떤 이끌림에 따라 창간 주주가 되었고, 지금은 배당금이 한번도 없었던 이 언론사의 최대 주주로 남아있다. 그는 인물사전에 ‘언론인’으로 나온다고 한다.
그해, 또 어떤 이끌림에 따라 ‘이우학원’에 발을 들여놓는다. 도시형 대안학교 이우는 100인의 자발적 기부를 종잣돈으로 출발했다. 그는 여기서도 시종 뒷배가 되었고, 월급 없는 이사장으로 여러 해 일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들어, 노무현 사람들이 ‘폐족’이 되어 나갈 즈음, 얼마 전 타계한 정수일 교수도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쫓겨났다. 그가 이 땅에서 오갈 데 없을 때, 한 공간이 열린다. ‘문명교류연구소’, 또 어떤 이끌림에 따라, 장석이 마련한 연구소다. 실크로드 답사를 비롯하여 학술, 출판 등 많은 일들을 함께했다. 정수일의 만년 역작들이 여기서 나왔다.
장석의 등단 햇수는 5·18 주기와 같다. 2020년 5·18 40주기, 장석은 40년 침묵을 깨고 시집 2권을 발표하면서 시단으로 돌아온다. 첫 시집 ‘사랑은 이제 막 태어난 것이니’, 그 첫편이 ‘서시’다. ‘온몸으로 앉아 있는 바위/ 전신만신의 둥근 달/ 혼신을 다해 붉은 꽃/ 멍청한 돌부처/ 그리고 사랑은/ 이제 막 태어난 것이니.’
은허맥수(殷墟麥穗)라 하여, 폐허가 되어버린 은나라 도읍지에 보리 이삭이 팬 것 같고, 절의 무덤인 폐사지에 늙은 돌부처, 옛 종소리를 홀로 듣고 있는 풍경 같다.
두번째 시집, ‘우리 별의 봄’. 그해는 노회찬 2주기이기도 하다. ‘…새하얀 분노로/ 나와 그대 사이의 금들이/ 덮여 있습니다/ 첫눈이라는 이름으로 덮여 있습니다.’(첫눈). 그리고 이어지는 시, 조시다. ‘너는 아주 빠르게 내려왔다/ …우리의 심장 속으로 쿵하고 들어왔다/ …다시 오르겠다/ 비창의 발걸음으로/ 너의 여진이 되어…/ 해일로 몰려가는 우리를 보아라.’
세번째 시집, ‘해변에 엎드려 있는 아이에게’. 여기에 그는 ‘오월은 마흔 번이 넘게 나를 깨웠네’라고 썼다. ‘…오월은/ 떨어지는 또 젊은 불꽃으로/ …삶에 늘 가래가 끓어/ 젊음에서 낡아가던 내 가난한 전성기/ …바다에 이르러 몸을 섞는 강물처럼/ …어깨에 손을 대고 흔드는 오월/ 이제 깨어 그곳으로 나도 흐르네.’
그해 계엄이, 그해 오월이, 이렇게 되풀이될지는 꿈에도 몰랐다. 악은 ‘계몽’처럼 변화하고 있다. 개선장군으로, 성직자의 모습으로, 천의 얼굴로 탈바꿈하며 악은 변주하고 있다. ‘앞서서 나가니 산 자여 따르라’는 김종률의 노래로는 막을 수 없다. 횃불과 촛불로는 그 얼굴을 분별할 수 없다. ‘멈춰져 버린 이 시간’, 우리 다시 만나기 위해서는 ‘소녀시대’를 불러야 하고, 바람에도 꺼지지 않는 엘이디(LED) 등을 켜야 한다. 시인은 그런 얘기를 했다. 그는 시, ‘오월은…’ 말미에 ‘남은 깃발이 있으면 주시오, 노인의 얼굴로 이제 봄길을 달리려 하네’라고 쓰고 있다.
2023년 네번째 시집 ‘그을린 고백’을, 이듬해 다섯번째 ‘목탄 소묘집’을 발표하며 장석은 늙은 전성기를 열고 있다. 시 선집 ‘너는 사람의 길을 가지 말아라’(연어의 꿈)가 일본에서 발간돼 아사히신문에 소개되기도 했다. 그는 세번째 시집을 내고 나서야 “‘너도 그때 용기는 다하지 못했지만 참 안 됐었다’라고 스스로 용서할 수 있었다”고 했다.
어디서 왔을까, 자꾸 잡아끄는 또 어떤 이끌림. 40년을 침묵하였으되 장석은 그 장력에서 이탈하지 않았다. 한 뿌리에서 뻗은 가지처럼, 손을 뻗으면 늘 닿을 거리에 있었던 그의 삶과 꿈, 그런 생각이 든다.
‘내가 숲이었다/ 젊은 참나무였다// 톱은 단지/ 수피와 심재를 후벼 끊었을 뿐// 나는 내 영혼을/ 드센 불의 정념에/ 적막의 시간에/ 의심 없는 어둠에 두어// 이렇게 검게 빛나며/ 비어 있었다// 어떤 인연이기에/ 빨갛게 이글거리는 눈을/ 다시 열어/ 당신의 영혼을 바라보는가.’
되살아나는, 꽃이 아닌 불꽃으로 되살아나는, 그의 시 ‘숯’의 전문이다.
이광이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